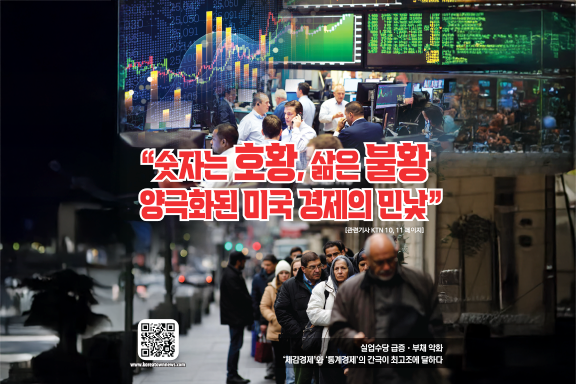커버스토리
경제가 좋다? 실상은 다르다!
페이지 정보
본문
주가 상승 뒤의 그림자, 셧다운 속 실업수당 급증이 드러낸 현실
미국 경제는 지금,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달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낙관론’이 넘친다. 다른 한쪽에서는 셧다운 장기화 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급증이 현실 경제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로는 ‘회복’이지만, 체감으로는 ‘불안’이다. “경제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주식 가진 사람만 ‘좋은 경제’를 느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경제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주식 보유 계층이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가계가 전체 주식의 약 89%를 보유하고 있다.
즉, 주가 상승이 곧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대다수 가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황은 분명하다. S&P500 지수는 2025년 들어 14%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같은 기간 19% 뛰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제자리다. 고용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
미시간대학 소비자조사센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를 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분석했다. 상위 소득층은 “경제가 안정적”이라 답했지만, 중·하위층은 “생활이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셧다운이 가린 경기 둔화 신호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사상 최장 셧다운(10월 1일 시작) 은 경제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통계국(BLS)은 매달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대체 지표인 “Initial Jobless Claims(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를 주목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 증가해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셧다운으로 고용 통계가 끊긴 상황에서, 실업수당 급증은 노동시장 둔화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컨센서스 추정에 따르면, “셧다운이 없었더라도 10월 비농업 고용은 약 6만 명 감소했을 것이며, 실업률은 4.5%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 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3년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약화의 초기 징후로 해석된다.
◈연준의 고민: 금리 인하? 물가 경계?
연방준비제도(Fed)는 지금 ‘데이터 없는 정책 결정’의 벼랑에 서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11월 12일 브리핑에서 “10월의 고용 및 물가 보고서는 아마도 영영 발표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셧다운으로 경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연준은 12월 9~10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린 상태다. “연준 위원 중 매파는 인플레이션 재확산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비둘기파는 고용 둔화를 이유로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3.75~4.0%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회견에서 “12월 인하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다(Far from it)’”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위원회 내부의 이견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다.
결국 ‘경제 데이터의 공백’ 은 연준의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12월 인하 가능성은 60%, 동결은 40%”로 예측되고 있다.
◈실업수당 급증, 가계부채 악화와 맞물려
고용 불안은 가계의 부채 문제와 직결된다.
미국 전체 가계부채는 올해 18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중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저신용(Subprime) 대출 부문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피치 레이팅스는 11월 보고서에서 “신용점수 600 이하 차주의 자동차대출 연체율이 6.6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도 높은 수치다. 금리 상승과 물가 부담이 누적되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트리컬로 홀딩스(Tricolor Holdings) 같은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가 9월에 파산한 사건은 금융권 전체의 불안을 키웠다. 이 회사는 달라스에 본사를 둔 중고차 판매 및 대출 기업으로, “대출 부실이 급격히 늘면서 유동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금융기관들의 부실노출액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실업 증가, 부채 악화, 그리고 신용경색이 맞물리면서 “표면적으로는 견조하지만 내부는 취약한 경제” 라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 위축, 블랙프라이데이마저 예전 같지 않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 유통업계의 분위기는 예년과 다르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인상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폭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깃(Target)·나이키(Nike)·코치(Coach) 등 주요 브랜드가 올해 평균 10~15%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재고비용이 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원가를 밀어 올렸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미국인의 연말 소비지출이 지난해보다 평균 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소비층의 지출은 23% 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체감경기와 통계경제의 괴리’
한쪽에서는 주식과 자산가격이 치솟고,다른 한쪽에서는 고용·소득·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양극화로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학자 다이앤 스웡크(Diane Swonk·KPMG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미국은 ‘경기 호황’과 ‘생활 불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례적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서민층 부담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월 말 기준 인플레이션(근원 CPI)은 전년 대비 2.9% 상승해 연준 목표치 2%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 식품·주거·보험료 등 생활 밀접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결과, 실질 임금 증가율은 0%대, 즉 “일을 해도 체감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누가 경제를 ‘좋다’고 느끼는가
데이터는 분명하다. 주가는 오르고, GDP는 성장하고, 공식 실업률은 낮다. 그러나 실제 경제를 체감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은 ‘나빠졌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주식 보유 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은 팬데믹 이후 약 47% 증가했지만, 하위 50%의 평균 저축액은 오히려 줄었다. 노동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자산소득은 폭등했다. ‘경제가 좋다’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연준의 선택이 갈림길
다가오는 12월, 연준의 결정은 2026년 경제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 둔화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이 있다.
금리를 동결하면 물가 안정에는 유리하지만, 고용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없는 정책결정이 가져올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한다.
셧다운으로 끊긴 통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다’는 인식조차, 지금은 믿기 어려운 수치 위에 서 있다. 2025년 가을의 미국 경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보이는 수치는 좋지만, 느껴지는 현실은 다르다.” 주식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늘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행렬이 길어지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그 성장의 주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마주한, ‘양극화된 호황’의 초상화다.
유광진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