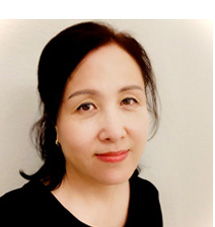KTN 칼럼
[백경혜] 뉴욕 논스톱
페이지 정보
본문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또다시 눈을 떴다.
창밖에선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한국과의 시차는 열네 시간. 밤낮이 바뀌어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거듭되는 소음에 뒤척이다 그냥 일어나 앉았다. 암막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한밤중이건만 요란하게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경찰차가 지나갔고, 도로의 맨홀 뚜껑은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불 꺼진 맞은편 빌딩 너머로 첩첩이 서 있는 또 다른 빌딩들이 보였다. 맨해튼 한복판에 와 있다는 게 실감 나기 시작했다. 첫 비행을 마친 해외 스테이션의 첫날이었다.
새롭고 신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가을, 형부가 항공사 승무원 모집 신문광고를 내밀었다. 합격할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열렬히 살고 싶다는 소망에 그 일이 적당해 보였다. 언니는 면접보러 갈 때 입을 옷을 사주었다. 브이넥에 흰 카라가 달린 그 담황색 원피스는 세상으로 나가는 첫 제복 같았다.
몇 차례 면접과 시험을 거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삼 개월이 걸렸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다고 해도 외국을 드나드는 직업에 필요한 서류가 한 보따리나 되던 시절이었다. 본사 입구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도 눈을 끔뻑이며 그대로 서 있었다. “안 될걸. 안 될 거야…” 하면서 거듭되는 시험을 치러왔고,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패스한 걸 신기해했는데, 최종 합격하고도 바보같이 어리둥절했다. 오래 안 쓰던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길 기다리듯 뜸을 들이며 서서히 기쁨이 몰려왔다. 나는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항상 과분하게 여기는 걸까.
자신을 믿든 안 믿든, 바라던 대로 승무원이 되었다. 교육원에서 필요한 수련을 마치고 팀에 배속되어 처음으로 받은 스케줄은 뉴욕 논스톱. 김포공항에서 제일 멀리 날아가는 비행이었다. 승무원 업무는 시간 맞춰 정확히 모이고 흩어지면서 시작된다. 비행마다 두 번의 브리핑과 한 번의 미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항공기 출발 시간에 따라 모이는 시간이 달라진다. 비행마다 출근 시간, 업무 시간, 시차, 목적지가 달라지니 바람에 불려 다니는 나뭇잎처럼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시간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기본이 되었다.
줄무늬 원피스에 빨간 재킷을 입고 왼쪽 가슴 위에 OJT(On The Job Training) 배지를 달았다. 네모난 승무원 카트 백에 여권과 기내화, 비행기 주방에서 사용할 도구 등을 챙겨 넣었다. 처음으로 투입되는 장거리 비행에 바짝 긴장했다.
비행기는 만석이었다. 이찌방 주니어 (いちばん Junior)라 불린, 막내 승무원의 역할은 항공기 입구에서 탑승하는 승객 모두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일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숙했지만, 선배들이 하는 걸 눈여겨보았다. 갤리(Galley) 안 작은 오븐에서 뜨끈하게 데워진 밀 캐서롤 (Meal Casserole)을 기내식 트레이로 옮기고, 아이스 빈(Ice Bin)에 음료 캔들을 쏟아 넣는 일, 커피를 내리고 화장실을 확인하는 것 등 신속하게 해내야 할 일이 많았다. 기내 판매대에 쇼핑백을 채우는 것도 막내의 몫이었다. 우왕좌왕하는 짧은 단발머리 신입에게 선배들은 따뜻하고 관대했다. 승객들 눈에 어찌 보였는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가슴에서 반짝이던 금색 OJT 배지를 보고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지 않았을까.
간밤의 소란스러움을 털어내고, 날 밝은 맨해튼 거리로 선배들을 따라나섰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빌딩들이 커다란 덩치로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34번가 메이시 백화점은 1902년에 완공되었다고 했다. 코너를 돌며 이어지는 커다란 쇼윈도 앞에서 한참 멈춰 서 있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기발한 디스플레이를 난생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초봄, 아직 쌀쌀한 뉴욕 거리에는 세상 모든 인종이 어깨를 맞대고 걸어 다녔다. 피부색과 체격, 생김새가 제각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경이로웠다. 작은 델리에서 샐러드와 수프를 먹고, 백화점에 가서 가족에게 줄 선물을 샀다. 사람뿐 아니라 물건들도 넘쳐났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에 가 있었고, 이제부터 세계의 대도시 하나하나에 도장을 찍듯 발자국을 남기게 될 터였다.
가끔 쌀쌀했던 그 뉴욕 거리가 생각난다. 그 모습을 그리다 보면 첫 직장 초년생 때 기억이 함께 묶인 세트인 양 줄줄이 끌려 나온다. 나는 아직도 가끔 갤리에서 일하는 꿈을 꾼다. 거기서도 허둥대며 열심을 낸다. 이상하게 나만 예전 유니폼을 입고 있다. 꿈꾸는 김에 고운 청자색 현재 유니폼을 한번 입혀주면 좋으련만 내 무의식은 입어보지 않은 옷을 고집스레 거부한다. 김포로 돌아가 새 유니폼을 주문해야지 다짐할 때쯤 꿈에서 깨어난다. 하고많은 멋진 도시를 두고 왜 그 꿈을 반복하여 꾸는 걸까. 어쩌면 나는 첫 비행의 기억을 애지중지 간직하고 있나 보다.
언젠가 맨해튼 그 거리를 천천히 다시 걸으며 추억의 빈 곳을 지금의 모습으로 채워 넣어야겠다. 이전 유니폼을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듯 생의 빛나는 순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나에게 속삭여 주고 싶다. 그때도 그날처럼 축제 같았으면 좋겠다.
젊음은 여전히 살아 여울여울 불씨를 날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