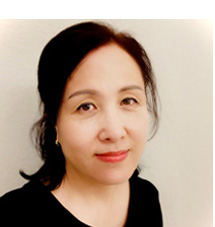KTN 칼럼
[수필] 게임하는 엄마
페이지 정보
본문
나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
대학에 다닐 땐 학교 앞 오락실에 갔다. 공강 때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과 학교 밖으로 나가 700원짜리 칼국수를 사 먹고 오는 길에 오락실에 들르곤 했다. 어두운 실내에 나란히 배치된 게임기에선 삐용삐용 신나는 전자음이 들렸다. 게임을 골라 동전 투입구에 5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다.
제일 좋아했던 게임은 ‘보글보글 (Bubble Bubble)’이었다. 두 마리의 귀여운 용이 입으로 방울을 쏘아 괴물을 가둔 다음 그것을 터트리면 요란하게 터지며 갇혀 있던 괴물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그 자리에 바나나, 복숭아 등 과일이 남았다. 방울을 모아서 한꺼번에 터트리면 케이크나 칵테일이 남기도 했다.
오락실은 세상과 낙원 사이 어디쯤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였다. 그곳은 대부분 너저분하고 침침했지만, 판타지에 딱 어울리는 배경이었다. 가지고 간 동전이 바닥날 때까지만 누리는 딴 세상이었다.
대학 졸업반일 때 컴퓨터가 강의실에 등장했다. IBM의 그 초기 컴퓨터를 쓰려면 여러 개의 명령어를 외워야 했다. 몇 년 후 애플의 매킨토시를 샀을 때 드디어 공짜로 집에서 팩맨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전이 필요 없는 게임은 재미없었다. 오락실 게임은 오락실에서 해야 제맛이었을까. 나의 첫 번째 게임은 그렇게 시들해졌다.
다시 게임하게 된 것은 두 아들의 엄마가 된 후였다. 용산전자상가 게임 가게에서 인기 있는 게임을 추천받았는데, 그중 몇 개는 평생에 기억에 남을 것이다.
‘툼 레이더’ 시리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나는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가 되어 폐허가 된 유적지에서 보물을 찾아냈고 도시의 빌딩 옥상에서 멀리뛰기를 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는 숨겨진 덫을 피해 가며 밧줄을 잡고 이동했고 나를 잡으려는 악당을 항해 샷건을 날리기도 했다.
‘디아블로2’는 다수의 적과 싸우는 핵 앤 슬래시(Hack and Slash) 게임이다. 원소 술사가 되어 불덩이를 날리기도 하고 얼음 화살을 소환하기도 하며 분투했지만, 중세 시대 배경의 으스스한 스토리와 나를 줄줄이 따라오는 적들의 괴이한 몰골에 등골이 오싹해지기 일쑤였다. 깊은 밤에 기묘한 배경 음향을 들으며 게임을 하면 우리 집 거실은 무시무시한 던전이 되었다. 용맹한 마법사여야 할 나는 사실 조무래기 적만 만나도 화들짝 놀라는 졸보였지만, 오직 엔딩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적진을 헤매고 다녔다. 짜릿한 공포 속에서 외롭게 퀘스트를 달성해 나갔던 그 밤들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 밖에도 퍼즐을 풀거나 강력한 적을 물리쳐야 다음 장면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도시를 기획하거나 캐릭터를 만들어 성공시키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었다. 게임을 계속하게 한 원동력은 호기심이며 그것은 내가 책이나 영화를 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으로 이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 점차 게임을 안 하게 되었다.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기에는 현실 세계가 너무 바빴다. 오랫동안 게임을 손에서 놓으니, 순발력이 떨어져 이제는 아이들 게임을 구경만 한다.
요즘 게임들은 그래픽도 정교해졌고, 게이머가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 등 스토리도 진화했다. 특히 유저들이 파티를 만들어 퀘스트를 함께 달성하는 온라인 게임이 대세인 듯 보인다.
엄마랑 같이 게임을 하며 자란 두 아들은 같은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선후배가 되었다. 독립하여 댈러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큰아들은 주말이면 샌머테이오와 디트로이트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방에서 만난다. 그리고 게임의 보스가 살고 있는 적진으로 함께 쳐들어간다. 타주에서 대학에 다니는 작은 아들은 가끔 게임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만나 근황을 나누고 종종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온라인 게임방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중요한 뒷골목이 되었다.
아들이 게임을 좀 오래 한다 싶을 때 보통은 그냥 아이에게 맡긴다. 잘 만든 게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절제하는 법도 이미 배웠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가끔 어릴 때 같이 한 게임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 눈이 반짝인다. 아마 내 눈도 반짝일 것이다. 그 게임 OST를 찾아 함께 들으며 게임의 장면을 회상하는 것은 함께 다녀온 특별한 여행을 추억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득히 그리운 그때를 신나게 이야기하며 아들과 나는 친구가 된다.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 비디오 게임을 하면 좋겠다고 한다. 앞으로 AI가 접목된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또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때는 아들과 온라인 뒷골목에서도 만나고 싶다.
비디오 게임은 다른 놀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게임 세계는 현실과 매우 달라 그 경험 자체가 특별하고, 게임에만 쓰는 명칭이 있어 게이머 아닌 사람은 잘 모르는 개념이 있다.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말을 하니 암호로 소통하는 동지가 된 듯하여 더 쉽게 친밀해지는 것 같다.
나에게 비디오 게임은 메마른 일상에 잠깐씩 내리는 소나기처럼 권태를 시원하게 날려준 깜짝 판타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더 따르고 사랑하게 해준 즐거운 경험이었다.
나 좋자고 한 일치고 꽤 짭짤하지 않은가.
-
- 이전글
- [경/제/칼/럼] 납세 의무
- 24.03.30
-
- 다음글
- [알아두면 유용한 식품상식] ‘뉴질랜드 그린홍합’
- 24.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